▣ 『논어(論語)』
卷 7
◎ 《술이(述而)》篇
◆ 7 - 36) 子曰: "奢則不孫, 儉則固, 與其不孫也, 寧固."
(자왈: "사즉불손, 검즉고, 여기불손야, 녕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치하면 공순(恭順)하지 않고, 검소하면 누추하지만, 공순하지 않음 보다는 차라리 누추함이 낫다.”
◎《논어집해(論語集解)》
【集解】 子曰:「奢則不孫,儉則固。與其不孫也,寧固。」(孔曰:「俱失之。奢不如儉,奢則僭上,儉不及禮。固,陋也。」 ◎공안국이 말하였다:<사치와 검소함이> 모두 <중도(中道)를> 잃었지만, 사치가 검소함만 못하며 사치하면 윗 <사람에> 주제넘고, 검소하면 예(禮)에 미치지 못한다. “고(固: 굳을 고)”는 누추한 것이다.)
◎《논어주소(論語註疏)》
○ 【註疏】 "子曰:奢則不孫,儉則固。與其不孫也,寧固”。
○ 【註疏】 <경문(經文)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치하면 공순(恭順)하지 않고, 검소하면 누추하지만, 공순하지 않음 보다는 차라리 누추함이 낫다.'[子曰 奢則不孫 儉則固 與其不孫也 寧固]까지"
○ 正義曰:此章戒人奢僭也。
○ 正義曰: 이 장(章)은 사람들이 사치하여 주제넘음을 경계하신 것이다.
孫,順也。固,陋也。言奢則僭上而不順,儉則逼下而窶陋,二者俱失之。
손(孫)은 유순(柔順)한 것이고, 고(固: 굳을 고)는 누추한 것이다. 사치(奢侈)하면 윗사람에게 주제넘어서 공순(恭順)하지 않고, 검소(儉素)하면 아랫사람을 핍박하여 가난하고 누추하다.
與其不順也,寧為窶陋,是奢不如儉也。以其奢則僭上,儉但不及禮耳。
두 가지가 모두 <중도(中道)를> 잃은 것이지만 공순(恭順)하지 않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하고 누추함을 하겠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사치(奢侈)가 검소(儉素)만 못한 것이다. 그로써 사치하면 윗사람에게 주제넘지만 검소하면 단지 예(禮)에 미치지 않을 뿐이기 때문이다.
▣ 『論語』 원문
◎ 《述而》篇 7 - 36
◆ 子曰: "奢則不孫, 儉則固, 與其不孫也, 寧固."
◎《논어집해(論語集解)》
子曰:「奢則不孫,儉則固。與其不孫也,寧固。」(孔曰:「俱失之。奢不如儉,奢則僭上,儉不及禮。固,陋也。」 )
◎《논어주소(論語註疏)》
疏“子曰:奢則不孫,儉則固。與其不孫也,寧固”。
○正義曰:此章戒人奢僭也。
孫,順也。固,陋也。言奢則僭上而不順,儉則逼下而窶陋,二者俱失之。
與其不順也,寧為窶陋,是奢不如儉也。以其奢則僭上,儉但不及禮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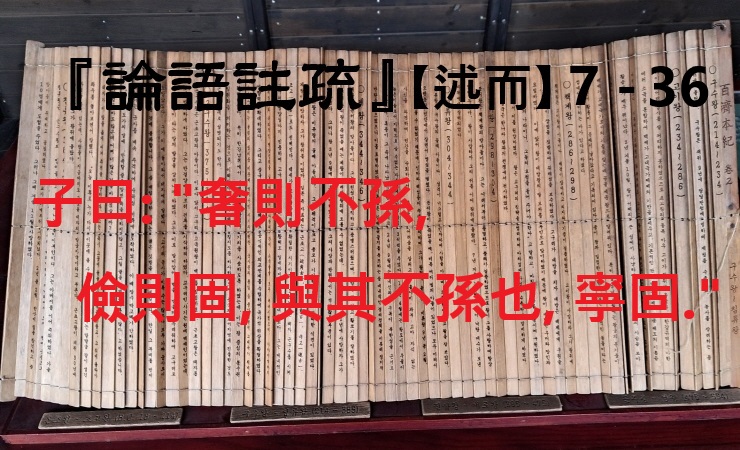
'◑논어주소(注疏)[刑昺] > 7.술이(述而)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논어주소(論語註疏)』 《술이(述而)》 卷 7 - 37 (0) | 2025.04.10 |
|---|---|
| ◎ 『논어주소(論語註疏)』 《술이(述而)》 卷 7 - 35 (1) | 2025.04.06 |
| ◎ 『논어주소(論語註疏)』 《술이(述而)》 卷 7 - 34 (0) | 2025.04.04 |
| ◎ 『논어주소(論語註疏)』 《술이(述而)》 卷 7 - 33 (1) | 2025.04.02 |
| ◎ 『논어주소(論語註疏)』 《술이(述而)》 卷 7 - 32 (0) | 2025.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