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詩經)』
≪국풍(國風) 제4-용풍(鄘風≫
◎ 47. 군자해로(君子偕老, 님과의 해로)
君子偕老 副笄六珈
(군자해로 부계육가)
군자와 해로하려고 꾸미게에 비녀 여섯 꾸몄다네
委委佗佗 如山如河
(위위타타 여산여하)
매우 의젓하고 마음 평온하여 산 같고 하수 같아
象服是宜
(상복시의)
상아와 복장이 이렇게 마땅한데도
子之不淑 云如之何
(자지불숙 운여지하)
그대의 정숙하지 않음은 어찌해서 인가요
玼兮玼兮 其之翟也
(자혜자혜 기지적야)
곱고도 성대한 그분의 꿩 깃옷[翟衣]이라네
鬒髮如雲 不屑髢也
(진발여운 불설체야)
검은머리 구름 같지만 가체머리 안 깨끗하네
玉之瑱也 象之揥也
(옥지진야 상지체야)
옥으로 만든 귀막이와 상아로 만든 빗치개에
揚且之晳也
(양저지석야)
훤칠한 이마가 희고도 밝으시니
胡然而天也 胡然而帝也
(호연이천야 호연이제야)
어찌 그리 하늘 같고 어찌 그리도 상제 같을까
瑳兮瑳兮 其之展也
(차혜차혜 기지전야)
곱고도 고우니 그분의 비단 옷[展衣]이라네
蒙彼縐絺 是紲袢也
(몽피추치 시설반야)
수놓은 갈포 위에 덧입으니 여름 속 적삼인데
子之淸揚 揚且之顔也
(자지청양 양저지안야)
그대의 맑음이 드날리니 얼굴 또한 드날리네
展如之人兮 邦之媛也
(전여지인혜 방지원야)
전의(展衣) 입은 사람이지만 왕도의 미인이라네
<君子偕老> 三章 一章七句 一章九句 一章八句
◎ 모시전(毛詩傳)
『모시전(毛詩傳)』은 한(漢)나라 모형(毛亨, ?~?)이 『시』에 전(傳)을 붙여 『모시고훈전(毛詩詁訓傳)』을 지었는데, 정현(鄭玄)이 전(箋)을 달고 공영달(孔穎達)이 소(疏)를 지어서 전해 오는 오늘날의 『시경』이다.
【毛詩序】 <君子偕老> 刺衛夫人也. 夫人淫亂, 失事君子之道, 故陳人君之德服飾之盛, 宜與君子偕老也.
【모시 서】 <군자해로(君子偕老)>는 위(衛)나라 부인을 풍자하였다. 부인이 음란하여, 군자를 섬기는 도리를 잃었기 때문에 군주의 덕과 복식(服飾)의 성대함을 펼쳐서 군자와 더불어 해로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君子偕老 副笄六珈
<군자와 해로하려고 꾸미게에 비녀 여섯 꾸몄다네>
【毛亨 傳】 能與君子俱老 乃宜居尊位 服盛服也. 副者, 后夫人之首飾 編髮爲之. 笄 衡笄也. 珈 笄飾之最盛者, 所以別尊卑.
【모형 전】 군자(君子)와 더블어 잘 갖추어 늙으니 이에 마땅히 존귀한 자리에 살고 성대한 복(服)을 입는다. 부(副)라는 것은, 후부인(后夫人)의 머리 장식인데 머리카락을 땋아서 만든다.
계(笄, 비녀 계)는 가로 꽂는 비녀이다. 가(珈, 머리꾸미개 가)는 비녀[笄]를 꾸미는 것 중 가장 성대한 것인데, 존귀함과 비천함을 구별하는 까닭이다.
委委佗佗 如山如河
<매우 의젓하고 마음 평온하여 산 같고 하수 같아>
【毛亨 傳】 委委者, 行可委曲蹤迹也. 佗佗者 德平易也. 山無不容 河無不潤. ○委佗 韓詩云 德之美貌.
【모형 전】 위위(委委)라는 것은, 굽은 발자취의 자취를 행하여 맏길 수 있음이다. 타타(佗佗)라는 것은, 덕이 평평함으로 바뀜이다. 산(山)은 허용하지 않음이 없고 하(河)는 윤택하지 않음이 없음이다.
○ 위(委)와 타(佗)를 ≪한 시≫에 이르기를 “덕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였다.
象服是宜
<상아와 복장이 이렇게 마땅한데도>
【毛亨 傳】 象服 尊者所以爲飾.
【모형 전】 상복(象服)은 존귀한 자가 꾸미려고 하는 까닭이다.
子之不淑 云如之何
<그대의 정숙하지 않음은 어찌해서 인가요>
【毛亨 傳】 有子若是, 何謂不善乎?
【모형 전】 그대 이와 같음이 있는데, 어찌 착하지 않다고 말하겠는가?
玼兮玼兮 其之翟也
<곱고도 성대한 그분의 꿩 깃옷[翟衣]이라네>
【毛亨 傳】 玼 鮮盛貌. 褕翟闕翟 羽飾衣也
【모형 전】 자(玼, 흉 자)는 곱고 성대한 모양이다. 유적(褕翟)과 궐적(闕翟)은 [꿩]깃으로 장식한 옷이다.
【石潭 案】 : 제후(諸侯) 부인의 옷은 유적(褕翟)이 최고이고, 궐적(闕翟)이 그 다음이며, 국의(鞠衣)가 그 다음이고, 전의(展衣)가 또 그 다음이다.
鬒髮如雲 不屑髢也
<검은머리 구름 같지만 가체머리 안 깨끗하네>
【毛亨 傳】 鬒 黑髮也. 如雲 言美長也. 屑 絜也.
【모형 전】 진(鬒, 숱 많고 검을 진)은 검은 머리이다. 여운(如雲)은 [머리카락이] 아름답고 긺을 말한다. 설(屑, 가루 설)은 깨끗함이다.
玉之瑱也 象之揥也
<옥으로 만든 귀막이와 상아로 만든 빗치개에>
【毛亨 傳】 瑱 塞耳也. 揥 所以摘髮也.
【모형 전】 전(瑱, 귀막이 옥 전)은 ‘귀막이’이다. 체(揥, 빗치개 체)는 머리카락을 들추어내는 까닭[도구]이다.
揚且之晳也
<훤칠한 이마가 희고도 밝으시니>
【毛亨 傳】 揚 眉上廣, 晳 白晳.
【모형 전】 양(揚, 날릴 양)은 눈썹 위가 넓음이고, 석(晳, 밝을 석)은 희고 밝음이다.
胡然而天也 胡然而帝也
<어찌 그리 하늘 같고 어찌 그리도 상제 같을까>
【毛亨 傳】 尊之如天 審諦如帝
【모형 전】 높기가 하늘과 같고, 자세히 살핌이 상제(上帝)와 같음이다.
瑳兮瑳兮 其之展也
<곱고도 고우니 그분의 비단 옷[展衣]이라네>
蒙彼縐絺 是紲袢也
<수놓은 갈포 위에 덧입으니 여름 속 적삼인데>
【毛亨 傳】 禮有展衣者, 以丹縠爲衣. 蒙 覆也. 絺之靡者爲縐 是當暑袢延之服也.
【모형 전】 예(禮)에 전의(展衣)라는 것이 있는데 붉은 비단으로써 만든 옷이다. 몽(蒙)은 덮음이다. 갈포 중에 올이 가는 것이 추(縐)이니, 이는 더위에 마땅하여 속에 늘여 입는 복장이다.
子之淸揚 揚且之顔也
<그대의 맑음이 드날리니 얼굴 또한 드날리네>
【毛亨 傳】 淸 視淸明也. 揚 廣揚 而顔角豐滿
【모형 전】 청(淸)은 맑고 밝게 보임이다. 양(揚)은 넓리 드날리면서 얼굴이 반듯하고 풍만한 것이다.
展如之人兮 邦之媛也
<전의(展衣) 입은 사람이지만 왕도의 미인이라네>
【毛亨 傳】 展 誠也. 美女爲媛.
【모형 전】 전(展)은 진실함이다. 아름다운 여자가 원(媛)이다.
<君子偕老> 三章 一章七句 一章九句 一章八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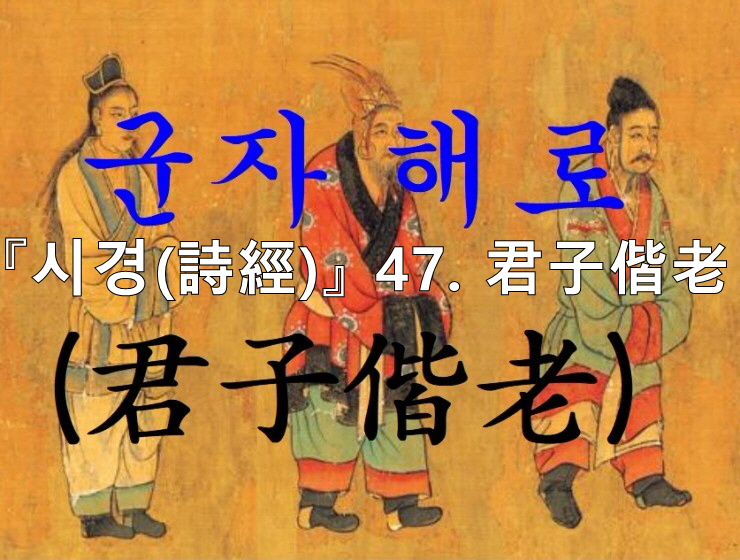
'▣ 시경(詩經) > ◑毛詩傳 305篇[모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경 46. 장유자(牆有茨, 담장의 남가새 풀)/毛詩傳 (0) | 2025.04.05 |
|---|---|
| ◎ 시경 45. 백주(柏舟, 측백나무 배)/毛詩傳 (0) | 2025.04.03 |
| ◎ 시경 44. 이자승주(二子乘舟, 형제가 탄 배)/毛詩傳 (0) | 2025.04.01 |
| ◎ 시경 43. 신대(新臺, 새 누대)/毛詩傳 (0) | 2025.03.30 |
| ◎시경 42. 정녀(靜女, 얌전한 아가씨)/毛詩傳 (0) | 2025.0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