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어(論語)』
卷 8
◎ 《태백(泰伯)》篇
◆ 8 - 21) 子曰: "禹, 吾無間然矣. 菲飮食而致孝乎鬼神, 惡衣服而致美乎黻冕, 卑宮室而盡力乎溝洫. 禹, 吾無間然矣."
(자왈: "우, 오무간연의. 비음식이치효호귀신, 오의복이치미호불면, 비궁실이진력호구혁. 우, 오무간연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禹) 왕은 내가 끼어들 그러함이 없다. 음식을 간소하게 하여서 귀신(鬼神)에게 효성을 다하시고, 의복을 검소하게 하여서 불면(黻冕≒祭服)을 아름답도록 하셨으며 궁실(宮室)을 낮추어서 도랑과 수로에 온 힘을 다하셨으니, 우(禹) 왕은 내가 끼어들들 그러함이 없도다.”
【石潭 案】 : 이제와 삼왕(二帝 三王)
이제(二帝)는 당(唐) 요(堯)임금과 우(虞) 순(舜)임금을 말하며, 삼왕(三王)은 하(夏)나라 우왕(禹王)과 상(商)나라 탕왕(湯王)과 주(周)나라 문왕(文王) 및 무왕(武王)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夏)나라 우(禹) 왕(王)은 우(禹)임금이 아니고 우(禹) 왕(王)이라고 해야 한다.
◎《논어집해(論語集解)》
【集解】 子曰:「禹,吾無間然矣。(孔曰:「孔子推禹功德之盛美,言己不能複間其間。」 ◎공안국이 말하였다:공자께서 우(禹) 왕의 공덕이 성대하고 아름다움을 추앙하시면서 자기가 다시 그 사이를 끼어들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菲飲食而致孝乎鬼神,(馬曰:「菲,薄也。致孝鬼神,祭祀豐絜。」 ◎마융이 말하였다:“비(菲: 엷을 비)”는 엷음이다. 귀신(鬼神)에게 효성을 다하신[致孝鬼神]것은, 제사가 풍성(豐盛)하고 깨끗하였음이다.)惡衣服而致美乎黻冕,(孔曰:「損其常服,以盛祭服。」 ◎공안국이 말하였다:그 평상복(平常服)은 줄이고 그로서 제복(祭服)을 성대하게 하였다.)卑宮室而盡力乎溝洫。(包曰:「方里為井,井間有溝,溝廣深四尺。十里為成,成間有洫,洫廣深八尺。」 ◎포함이 말하였다:사방(四方) 1리(里)가 정(井)이 되고, 정 사이에 도랑(≒溝)이 있는데, 도랑은 넓이와 깊이가 4척(尺)이다. 10리(里)가 성(成)이라 되고 성 사이에 봇도랑(≒洫)이 있으며, 봇도랑의 넓이와 깊이가 8척(尺)이다.)禹,吾無間然矣。」
◎《논어주소(論語註疏)》
『논어주소(論語註疏)』는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하안(何晏, 193~249 魏)이 주(註)를 달아 논어집해(論語集解)를 지었으며, 북송(北宋)의 형병(邢昺, 932~1010)이 논어집해(論語集解)에 소(疏)를 붙여서 논어주소(論語註疏)를 지었다.
○ 【註疏】 “子曰”至“然矣”。
○ 【註疏】 <경문(經文)의> “[자왈(子曰)]에서 [연의(然矣)]까지"
○正義曰:此章美夏禹之功德也。
○ 正義曰 : 이 장(章)은 하(夏)나라 우(禹) 왕의 공덕(功德)을 찬미(讚美)한 것이다.
“子曰:禹,吾無間然矣”者,間謂間廁。孔子推禹功德之盛美,言已不能複間其間也。
<경문(經文)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禹) 왕은 내가 끼어들 그러함이 없다[子曰 禹 吾無間然矣]"라는 것의, 간(間:사이) 은 사이에 섞임(間廁≒끼어듦)을 말한다. 공자께서 우(禹) 왕의 공덕이 성대하고 아름다움을 추앙하시면서 자기가 다시 그 사이를 끼어들 수가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참고】 『說文解字』 閒者,隙之可尋者也。故曰閒廁,曰閒迭,曰閒隔,曰閒諜。『釋名』曰:廁, 言人雜廁在上非一也。
“菲飲食而致孝乎鬼神”者,此下言其無間之三事也。菲,薄也。薄己飲食,致孝鬼神,令祭祀之物豐多絜靜也。
<경문(經文)에서> "음식을 간소하게 하여서 귀신(鬼神)에게 효성을 다하시고[菲飮食而致孝乎鬼神]"라는 것은, 이 아래는 그 끼어들 틈이 없는 세 가지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비(菲: 엷을 비)”는 엷음이며, 자기의 음식은 간소 하고 귀신(鬼神)에게는 효성(孝誠)을 다하여 제사의 제물(祭物)을 풍성(豐盛)하고 정결(精潔)하도록 하신 것이다.
“惡衣服而致美乎黻冕”者,黻冕,皆祭服也。言禹降損其常服,以盛美其祭服也。
<경문(經文)에서> "의복을 검소하게 하여서 불면(黻冕≒祭服)을 아름답도록 하셨으며[惡衣服而致美乎黻冕]"라는 것은, 불(黻: 수 불)과 면(冕: 면류관 면)은 모두 제복(祭服)이다. 우(禹) 왕이 평상복(平常服)을 줄이고 덜어서 그로서 제복(祭服)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말이다.
“卑宮室而盡力乎溝洫”者,溝洫,田間通水之道也。言禹卑下所居之宮室,而盡力以治田間之溝洫也。
<경문(經文)에서> "궁실(宮室)을 낮추어서 도랑과 수로에 온 힘을 다하셨으니[卑宮室而盡力乎溝洫]"라는 것은, 구혁(溝洫)은 전지(田地) 사이의 물이 통하는 길이다. 우(禹) 왕이 사는 곳의 궁실(宮室)을 낮게 낮추고 그로서 전지(田地) 사이에 도랑과 수로를 다스리는데 온 힘을 다하였다는 말이다.
以常人之情,飲食務於肥,濃禹則淡薄之;衣服好其華美,禹則粗惡之;宮室多尚高廣,禹則卑下之。
일상적인 사람의 정(情)으로서 음식은 살지고 맛있게 하는데 힘쓰지만 우(禹) 왕은 거칠고 간소하게 드셨으며, 의복(衣服)은 화려(華麗)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지만 우(禹) 왕은 거칠고 나쁘게 입으셨으며, 궁실(宮室)은 오히려 높고 넓음이 많았지만 우(禹) 왕은 나지막한 아래에 사셨다.
飲食,鬼神所享,故云致孝;祭服備其采章,故云致美,溝洫人功所為,故云盡力也。
음식(飮食)은 귀신(鬼神)이 흠향(歆饗)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르기를 ‘효성(孝誠)을 다하였다.’라고 하였고, 제복(祭服)은 그 채장(采章≒彩色)을 갖추기 때문에 이르기를 ‘아름다움을 다하였다.’라고 하였으며, 구혁(溝洫)은 사람의 공(功)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르기를 ‘힘을 다하였다.’라고 한 것이다.
“禹,吾無間然矣”者,美之深,故再言之。
<경문(經文)에서> "우(禹) 왕은 내가 간여할 그러함이 없도다[禹吾無間然矣]"라는 것은, 찬미(讚美)함이 깊기 때문에 재차(再次) 말씀하신 것이다.
○注“孔曰:損其常服,以盛祭服”。
○ <집해(集解)> 주(注)의 “공안국이 말하였다:그 평상복(平常服)은 줄이고 그로서 제복(祭服)을 성대하게 하였다[孔曰:損其常服,以盛祭服]까지"
○正義曰:鄭玄注此云:“黻,是祭服之衣。冕,其冠也。”
○正義曰 : 정현(鄭玄)이 주(注)에 이것을 이르기를 “불(黻: 수 불)은 바로 제복(祭服)의 옷이고, 면(冕: 면류관 면)은 제사에 쓰는 관(冠)이다.”라고 하였다.
《左傳》“晉侯以黻冕命士會”亦當然也。黻,蔽膝也。祭服謂之黻,其他謂之韠,俱以韋為之,製同而色異。韠,各從裳色。黻,其色皆赤,尊卑以深淺為異,天子純朱,諸侯黃朱,大夫赤而已。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진(晉)나라 제후가 〈주왕(周王)에게 청하기를〉 사회(士會)에게 불면(黻冕)을 내리고서 <중군(中軍)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라고 했는데, 또한 <불면(黻冕)도> 마땅히 그러한 것이다. 불(黻)이라 말하고 다른 경우에는 필(韠: 슬갑 필)이라 말하며, 모두 가죽(韋)으로 만드는데 만드는 방식은 같지만 색이 다르다. 필(韠)은 각각 치마의 색깔에 따르고, 불(黻)은 그 색이 모두 붉은 색인데 높고 낮음에 따라 <색깔의> 짙고 옅음을 다르게 하였으며, 천자(天子)는 순주색(純朱色), 제후는 황주색(黃朱色), 대부(大夫)는 적색(赤色)일 뿐이다.
大夫以上,冕服悉皆有黻,故禹言黻冕。《左傳》亦言黻冕,但冕服自有尊卑耳。
대부(大夫) 이상은 면복(冕服)에 모두 다 불(黻)을 착용하기 때문에 우(禹) 왕이 ‘불면(黻冕)’을 하였다고 말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도 역시 ‘불면(黻冕)’을 말했으나, 단지 면복(冕服)은 본래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이다.
《周禮·司服》云:“王之服,祀昊天上帝則服大裘而冕,祀五帝亦如之,享先王則袞冕,享先公饗射則鷩冕,祀四望山川則毳冕,祭社稷五祀則希冕,祭群小祀則玄冕。”
《주례(周禮)》 〈사복(司服)〉에 이르기를 “왕(王)의 복장(服裝)은 하늘의 상제(上帝)에게 제사(祭祀) 지내면 대구(大裘)를 입고서 면관(冕冠)을 쓰고, 오제(五帝)에게 제사 지낼 때도 이와 같으며, 선왕(先王)에게 제향(祭享)하면 곤룡포에 면관(冕冠)을 쓰고, 선공(先公)을 제향(祭享)하거나 향사례(饗射禮)를 하면 별의(鷩衣)에 면관(冕冠)을 쓰며, 사망(四望≒四方의 名山)과 산천(山川)에 제사 지내면 취의(毳衣)에 면관(冕冠)을 쓰고, 사직(社稷)과 오사(五祀)에 제사 지내면 희의(希衣)를 입고 면관(冕冠)을 쓰며, 군소(群小)에 제사를 지내면 현의(玄衣)에 면관(冕冠)을 쓴다.”라고 하였다.
“孤之服,自希冕而下。”《左傳》士會黻冕,當是希冕也。此禹之黻冕,則六冕皆是也。
“고(孤)의 복장(服裝)은 희의(希衣)에 면관(冕冠)부터 이하(≒玄冕까지)이다.”라고 하였으니,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사회(士會)에게 내린 불면(黻冕)도 당연히 이 희면(希冕)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말한 우(禹) 왕의 불면(黻冕)은 여섯 가지 면복(冕服)이 모두 이것이다.
○注“包曰”至“八尺”。
○ <집해(集解)> 주(注)의 “[포왈(包曰)]에서 [팔척(八尺)]까지"
○正義曰:“方裏為井,井間有溝,溝廣深四尺。十里為成,成間有洫,洫廣深八尺”者,案《考工記》:“匠人為溝洫。耜廣五寸,二耜為耦。
○正義曰 : <집해(集解) 주(注)에> "사방(四方) 1리(里)가 정(井)이 되고, 정 사이에 도랑(≒溝)이 있는데, 도랑은 넓이와 깊이가 4척(尺)이다. 10리(里)가 성(成)이라 되고 성 사이에 봇도랑(≒洫)이 있으며, 봇도랑의 넓이와 깊이가 8척(尺)이다[方里爲井 井間有溝 溝廣深四尺 十里爲成 成間有洫 洫廣深八尺]"라는 것은.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를 살펴보건대 “장인(匠人)은 구(溝)와 혁(洫)을 만든다. 보습(≒耜)의 너비는 5寸인데, 두 개의 보습을 한 짝으로 삼는다.
一耦之伐,廣尺深尺謂之畎。田首倍之,廣二尺深二尺謂之遂。九夫為井,井間廣四尺深四尺謂之溝。方十里為成,成間廣八尺深八尺謂之洫。方百里為同,同間廣二尋深二仞謂之澮。”
한 짝으로 작업(≒伐)한 너비 1尺 깊이 1尺을 '밭도랑(畎≒畝)'이라 하고, 밭머리에 이보다 배가 되는 너비 2尺 깊이 2尺을 수로(遂≒水路)라고 말한다. 아홉 농부(農家)의 <땅이> 정(井)이 되고, 정(井)과 정(井) 사이의 너비 4척 깊이 4척인 <수로(水路)를> '구(溝)'라고 하며, 사방(四方) 10리(里) 땅을 성(成)이라 하는데, 성(成)과 성(成) 사이의 너비 8척 깊이 8척인 <수로(水路)를> '혁(洫)'이라고 한다. 사방 100里를 동(同)이라 하는데, 동(同)과 동(同) 사이의 너비 2심(尋≒16척) 깊이 2인(仞≒16척)인 <수로(水路)를> '회(澮)'라고 말한다.”라고 하였다.
鄭注云:“此畿內采地之製。九夫為井。井者,方一里,九夫所治之田也。采地製井田異於鄉遂及公邑。三夫為屋。屋,具也。一井之中,三屋九夫,三三相具以出賦稅。共治溝也,方十里為成,成中容一甸,甸方八里出田稅,緣邊一里治洫。方百里為同,同中容四都六十四成,方八十里出田稅,緣邊十里治澮。”是溝洫之法也。
정현(鄭玄)이 주(注)에 이르기를 “이것은 기내(畿內)의 채지(采地)의 제도(制度)이다. 9부(夫)를 정(井)이 되며, 정(井)은 사방(四方) 1리(里)를 아홉 농부가 경작하는 전지(田地)이다. 채지(采地)에 정전(井田)을 만드는데 향(鄕)과 수(遂) 및 공읍(公邑)과는 다르다.
3부(夫)를 옥(屋)이라 하는데, 옥(屋)은 모두함이다. 1정(井)의 안에 3옥(屋) 즉 9부(夫)가 있으며, 3부(夫) 와 3부가 서로 함께하여 그로써 부세(賦稅)를 내고 함께 도랑(溝≒水路)를 정비한다. 사방(四方) 10리(里)를 성(成)이라 하며, 성(成) 안에 1전(甸)을 수용하고 1전(甸)은 사방(四方) 8리(里)인데 전세(田稅)를 내고, 그 바깥둘레 1리(里)의 <농민이> 혁(洫≒봇도랑)을 정비한다. 사방 100리(里)를 동(同)이라 하는데, 동(同) 안에 4도(都) 64성(成)이 포함되어 있다. 사방 80리(里)의 <농민이> 전세(田稅)를 내고, 그 바깥둘레 10리(里)의 <농민이> 회(澮≒봇도랑)를 정비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구혁(溝洫)의 제도(制度)이다.
▣ 『論語』 원문
◎ 《泰伯》篇 8 - 21
◆ 子曰: "禹, 吾無間然矣. 菲飮食而致孝乎鬼神, 惡衣服而致美乎黻冕, 卑宮室而盡力乎溝洫. 禹, 吾無間然矣."
◎《논어집해(論語集解)》
子曰:「禹,吾無間然矣。(孔曰:「孔子推禹功德之盛美,言己不能複間其間。」)菲飲食而致孝乎鬼神,(馬曰:「菲,薄也。致孝鬼神,祭祀豐絜。」)惡衣服而致美乎黻冕,(孔曰:「損其常服,以盛祭服。」 )卑宮室而盡力乎溝洫。(包曰:「方里為井,井間有溝,溝廣深四尺。十里為成,成間有洫,洫廣深八尺。」)禹,吾無間然矣。」
◎《논어주소(論語註疏)》
疏“ 子曰”至“然矣”。
○正義曰:此章美夏禹之功德也。
“子曰:禹,吾無間然矣”者,間謂間廁。孔子推禹功德之盛美,言已不能複間其間也。
“菲飲食而致孝乎鬼神”者,此下言其無間之三事也。菲,薄也。薄己飲食,致孝鬼神,令祭祀之物豐多絜靜也。
“惡衣服而致美乎黻冕”者,黻冕,皆祭服也。言禹降損其常服,以盛美其祭服也。
“卑宮室而盡力乎溝洫”者,溝洫,田間通水之道也。言禹卑下所居之宮室,而盡力以治田間之溝洫也。以常人之情,飲食務於肥,濃禹則淡薄之;衣服好其華美,禹則粗惡之;宮室多尚高廣,禹則卑下之。飲食,鬼神所享,故云致孝;祭服備其采章,故云致美,溝洫人功所為,故云盡力也。
“禹,吾無間然矣”者,美之深,故再言之。
○注“孔曰:損其常服,以盛祭服”。
○正義曰:鄭玄注此云:“黻,是祭服之衣。冕,其冠也。”
《左傳》“晉侯以黻冕命士會”亦當然也。黻,蔽膝也。祭服謂之黻,其他謂之韠,俱以韋為之,製同而色異。韠,各從裳色。黻,其色皆赤,尊卑以深淺為異,天子純朱,諸侯黃朱,大夫赤而已。大夫以上,冕服悉皆有黻,故禹言黻冕。《左傳》亦言黻冕,但冕服自有尊卑耳。《周禮·司服》云:“王之服,祀昊天上帝則服大裘而冕,祀五帝亦如之,享先王則袞冕,享先公饗射則鷩冕,祀四望山川則毳冕,祭社稷五祀則希冕,祭群小祀則玄冕。”“孤之服,自希冕而下。”《左傳》士會黻冕,當是希冕也。此禹之黻冕,則六冕皆是也。
○注“包曰”至“八尺”。
○正義曰:“方裏為井,井間有溝,溝廣深四尺。十里為成,成間有洫,洫廣深八尺”者,案《考工記》:“匠人為溝洫。
耜廣五寸,二耜為耦。一耦之伐,廣尺深尺謂之畎。田首倍之,廣二尺深二尺謂之遂。九夫為井,井間廣四尺深四尺謂之溝。方十里為成,成間廣八尺深八尺謂之洫。方百里為同,同間廣二尋深二仞謂之澮。”鄭注云:“此畿內采地之製。九夫為井。井者,方一里,九夫所治之田也。采地製井田異於鄉遂及公邑。三夫為屋。屋,具也。一井之中,三屋九夫,三三相具以出賦稅。共治溝也,方十里為成,成中容一甸,甸方八里出田稅,緣邊一里治洫。方百里為同,同中容四都六十四成,方八十里出田稅,緣邊十里治澮。”是溝洫之法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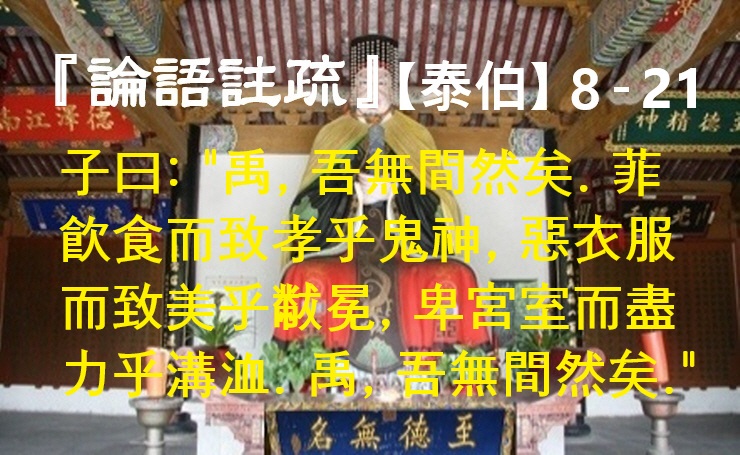
'◑논어주소(注疏)[刑昺] > 8.태백(泰伯)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논어주소(論語註疏)』 《태백(泰伯)》 卷 8 - 20 (2) | 2025.05.22 |
|---|---|
| ◎ 『논어주소(論語註疏)』 《태백(泰伯)》 卷 8 - 19 (0) | 2025.05.20 |
| ◎ 『논어주소(論語註疏)』 《태백(泰伯)》 卷 8 - 18 (0) | 2025.05.18 |
| ◎ 『논어주소(論語註疏)』 《태백(泰伯)》 卷 8 - 17 (0) | 2025.05.16 |
| ◎ 『논어주소(論語註疏)』 《태백(泰伯)》 卷 8 - 16 (0) | 2025.05.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