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어(論語)』
卷 7
◎ 《술이(述而)》篇
◆ 7 - 31) 陳司敗問: "昭公知禮乎?" 孔子曰: "知禮." 孔子退. 揖巫馬期而進之, 曰: "吾聞君子不黨, 君子亦黨乎? 君取於吳, 爲同姓, 謂之吳孟子. 君而知禮, 孰不知禮?" 巫馬期以告, 子曰: "丘也幸, 苟有過, 人必知之."
(진사패문: "소공지례호?" 공자왈: "지례." 공자퇴, 읍무마기이진지, 왈: "오문군자불당, 군자역당호? 군취어오, 위동성, 위지오맹자. 군이지례, 숙부지례?" 무마기이고, 자왈: "구야행, 구유과, 인필지지.")
진(陳)나라 사패(司敗)가 물었다. “소공(昭公)은 예(禮)를 알았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를 아셨습니다.” 공자께서 나가시자, <사패가> 무마기(巫馬期)에게 읍하며 나아가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 군자는 당(黨)을 하지 않는데, 군자도 또한 당을 합니까? 군주(≒魯 昭公)가 오(吳)나라에서 <여자를> 취하여 같은 성을 <부인으로> 하였는데도 오맹자(吳孟子)라고 말한 군주인데 예를 안다고 한다면 누가 예를 알지 못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무마기가 <사패의 말을> 알려 드리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丘)는 다행이다, 진실로 허물이 있으면 남들이 반드시 그것을 아는구나.”
◎《논어집해(論語集解)》
【集解】 陳司敗問:「昭公知禮乎?」(孔曰:「 司敗,官名,陳大夫。昭公,魯昭公。」 ◎공안국이 말하였다:“사패(司敗)”는 관직의 이름이며, 진(陳)나라의 대부이다. “소공(昭公)”은 노(魯)나라 소공이다.)孔子曰:「知禮。」孔子退,揖巫馬期而進之,曰:「吾聞君子不黨,君子亦黨乎?君取於吳,為同姓,謂之吳孟子。君而知禮,孰不知禮?」(孔曰:「巫馬期,弟子,名施。相助匿非曰黨。魯,吳俱姬姓,禮同姓不昏,而君取之;當稱吳姬,諱曰孟子。」 ◎공안국이 말하였다: “무마기(巫馬期)”는 제자이며 이름은 시(施)이다. 서로 도와 잘못을 숨기는 것을 '당(黨)'이라 한다. 노(魯)나라와 오(吳)나라는 모두 성이 '희(姬)'이다. 예(禮)에 같은 성(姓)이면 혼인을 하지 않는데 군주가 그<오나라 여인>를 취했으니 마땅히 오희(吳姬)라고 불러야 하는데 숨기고서 맹자(孟子)라고 말했다.)巫馬期以告。子曰:「丘也幸,苟有過,人必知之。」(孔曰:「以司敗之言告也。諱國惡,禮也。聖人道弘,故受以為過。」 ◎공안국이 말하였다:사패의 말을 가지고 알려 준 것이다. 나라의 악(惡)을 숨기는 것이 예(禮)이다. 성인(聖人)의 도(道)는 넓기 때문에 받아들여 잘못으로 여겼다,)
◎《논어주소(論語註疏)》
○ 【註疏】 "陳司”至“知之”。
○ 【註疏】 <경문(經文)의> "[진사(陳司)]부터 [지지(知之)]까지"
○正義曰:此章記孔子諱國惡之禮也。
○ 正義曰: 이 장(章)은 공자께서 나라의 악(惡)을 숨김이 예(禮)라는 것을 기록하였다.
“陳司敗問:昭公知禮乎”者,陳大夫為司寇之官,舊聞魯昭公有違禮之事,故問孔子,昭公知禮乎。
<경문(經文)에서> "진(陳)나라 사패(司敗)가 물었다. '소공(昭公)은 예(禮)를 알았습니까?'[陳司敗問 昭公知禮乎]"라는 것은, 진(陳)나라 대부(大夫)가 사패의 관직을 맡았는데 전에 노(魯)나라 소공(昭公)이 예(禮)를 어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공자에게 ‘소공(昭公)이 예(禮)를 알았느냐?’고 물은 것이다.
“孔子曰:知禮”者,答言昭公知禮也。
<경문(經文)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를 아셨습니다.'[孔子曰 知禮]"라는 것은, ‘소공(昭公)이 예(禮)를 아셨다.’고 대답하신 것이다.
“孔子退,揖巫馬期而進之,曰:吾聞君子不黨,君子亦黨乎”者,相助匿非曰黨。
<경문(經文)에서> "공자께서 나가시자, <사패가> 무마기(巫馬期)에게 읍하며 나아가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 군자는 당(黨)을 하지 않는데, 군자도 또한 당을 합니까?[孔子退 揖巫馬期而進之 曰吾聞君子不黨 君子亦黨乎]"라는 것은, 서로 도와 비리(非理)를 숨기는 것을 당(黨)이라 한다.
孔子既答司敗而退去,司敗複揖弟子巫馬期而進之,問曰:“我聞君子不阿黨,今孔子言昭公知禮,乃是君子亦有黨乎?
공자께서 이미 사패(司敗)에게 대답하고 나서 물러가시니, 사패가 다시 제자 무마기(巫馬期)에게 읍(揖)하고서 그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우리가 듣기에 군자는 당(黨)에 의지(依支)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공자는 소공(昭公)이 예(禮)를 아셨다고 말하였으니, 이에 바로 군자도 당(黨)을 합니까?’라고 물은 것이다.
“君取於吳,為同姓,謂之吳孟子。君而知禮,孰不知禮”者,孰,誰也。魯、吳俱姬姓。
<경문(經文)에서> "군주(≒魯 昭公)가 오(吳)나라에서 <여자를> 취하여 같은 성을 <부인으로> 하였는데도 오맹자(吳孟子)라고 말한 군주인데 예를 안다고 한다면 누가 예를 알지 못하겠습니까?[君取於吳 爲同姓 謂之吳孟子 君而知禮 孰不知禮]"라는 것의, 숙(孰: 누구 숙)은 누구이다. 노(魯)나라와 오(吳)나라는 모두 성이 희(姬)이다.
禮同姓不昏,而君取之,當稱吳姬。為是同姓,諱之,故謂之吳孟子。若以魯君昭公而為知禮,又誰不知禮也?
예(禮)에 같은 성(姓)은 혼인(婚姻)을 하지 않는데도, 군주가 <오나라 여인을> 취했으니 마땅히 오희(吳姬)라고 칭(稱)해야 하는데, 이(婚姻)를 동성(同姓)을 숨기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르기를 ‘오맹자(吳孟子)’라고 하였다. 만약 노(魯)나라 군주 소공(昭公)을 가지고 예(禮)를 알았다고 한다면 또 누가 예(禮)를 알지 못하겠느냐는 것이다.
“巫馬期以告,子曰:丘也幸,苟有過,人必知之”者,巫馬期以司敗之言告孔子也。
<경문(經文)에서> "무마기가 <사패의 말을> 알려 드리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丘)는 다행이다, 진실로 허물이 있으면 남들이 반드시 그것을 아는구나.'[巫馬期以告 子曰 丘也幸 苟有過 人必知之]"라는 것은, 무마기(巫馬期)가 사패(司敗)의 말을 가지고 공자(孔子)에게 아뢴 것이다.
孔子初言昭公知禮,是諱國惡也。諱國惡,禮也。但聖人道弘,故受以為過,言丘也幸,苟有過,人必知之也。
공자께서 처음에 ‘소공(昭公)이 예(禮)를 아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라의 수치(≒惡)를 숨기신 것이다. 나라의 악(惡)을 숨기는 것이 예(禮)이지만, 다만 성인(聖人)은 도(道)가 넓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들여 허물로 여기시면서 ‘나는 다행(多幸)이다. 진실로 잘못이 있으면 남들이 반드시 아는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注“司敗,官名,陳大夫”。
○ <집해(集解)> 주(注)의 “사패(司敗)는 관직의 이름이며, 진(陳)나라의 대부이다[司敗 官名 陳大夫]까지"
○正義曰:文十(一)年《左傳》云:楚子西曰:“臣歸死於司敗也。”
○正義曰: 문공(文公) 10년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초(楚)나라 자서(子西)가 말하기를 ‘신(臣)은 돌아가 사패(司敗)에게 죽겠습니다.’라고 했다.” 하였다.
杜注云“陳、楚名司寇為司敗”也。
두예(杜預)의 주(注)에 이르기를 “진(陳)나라와 초(楚)나라는 사구(司寇)의 명칭을 사패(司敗)라고 했다.”고 하였다.
《傳》言歸死於司敗,知司敗主刑之官,司寇是也。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사패(司敗)에게 가서 죽겠다.’고 말하였으니, 사패(司敗)가 형옥(刑罰)을 주관하는 관직임을 알 수 있으니, 바로 사구(司寇)이다.
此云陳司敗,楚子西亦云司敗,知陳、楚同此名也。
이곳에 이르기를 ‘진(陳)나라 사패(司敗)’라고 하였고, 초(楚)나라 자서(子西)도 역시 이르기를 ‘사패(司敗)’로 하였으니, 진(陳)나라와 초(楚)나라가 이 명칭을 같이했음을 아는 것이다.
○注“ 孔曰”至“孟子”。
○ <집해(集解)> 주(注)의 “[공왈(孔曰)]에서 [맹자(孟子)]까지"
○正義曰:云“巫馬期弟子,名施”者,《史記·弟子傳》云:“巫馬施字子旗,少孔子三十歲。”鄭玄云:“魯人也。”
○正義曰: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무마기(巫馬期)는 제자이며 이름은 시(施)이다[巫馬期 弟子 名施]"라는 것은,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이르기를 “무마기(巫馬施)는 자(字)가 자기(子旗)이고, 공자보다 30세 적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이 이르기를 “노(魯)나라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云“魯、吳俱姬姓”者,魯,周公之後;吳,泰伯之後,故云俱姬姓也。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노(魯)나라와 오(吳)나라는 모두 성이 '희(姬)'이다[魯吳俱姬姓]"라는 것은, 노(魯)나라는 주공(周公)의 후예이고, 오(吳)나라는 태백(泰伯)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르기를 "모두 성이 희(姬)이다."라고 한 것이다.
云“禮同姓不昏”者,《曲禮》云:“取妻不取同姓,故買妾不知其姓則卜之。”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예(禮)에 같은 성(姓)이면 혼인을 하지 않는데[禮同姓不昏]"라는 것은,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아내를 취하되 동성(同姓)을 취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첩(妾)을 살 때 성(姓)을 알지 못하면 점(占)을 친다.”라고 하였다.
又《大傳》曰:“係之以姓而弗別,綴之以食而弗殊,雖百世而昏姻不通者,周道然也。”
또 《예기(禮記)》 〈대전(大傳)〉에 말하기를 “〈같은〉 성(姓)으로 묶이면 분별이 안되고, 식구(食口)로서 묶으면서 <대우를> 달리하지 않으니, 비록 <동성(同姓)은 촌수가> 아무리 멀어도 혼인(婚姻)을 하지 않는 것은 주(周)나라 제도가 그러하였다.”라고 하였다.
云“而君取之,當稱吳姬,而諱曰孟子”者,案《春秋》哀十二年:“夏,五月,甲辰,孟子卒。”《左氏傳》曰:“昭公娶於吳,故不書姓。”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군주가 그<오나라 여인>를 취했으니 마땅히 오희(吳姬)라고 불러야 하는데 숨기고서 맹자(孟子)라고 말했다[而君取之 當稱吳姬 而諱曰孟子]"라는 것은, 상고해보건대, 《춘추(春秋)》 애공(哀公) 12년에 “여름 5월 갑진일(甲辰日)에 맹자(孟子)가 졸(卒)하였다.”라고 했는데,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말하기를 “소공(昭公)이 오(吳)나라에서 <아내를> 취하였기 때문에 경문(經)에 성(姓)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此云“君娶於吳,為同姓,謂之吳孟子”,是魯人常言稱孟子也。
이곳에 이르기를 “군주가 오(吳)나라에서 취하여 <혼인을> 동성(同姓)끼리 했는데도 오맹자(吳孟子)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노(魯)나라 사람들이 늘상 말하기를 ‘맹자(孟子)’로 칭했다는 것이다.
《坊記》云:“《魯春秋》去夫人之姓曰吳,其死曰孟子卒。”是舊史書為“孟子卒”,及仲尼脩《春秋》,以魯人已知其非,諱而不稱姬氏。諱國惡,禮也,因而不改,所以順時世也。
《예기(禮記)》 〈방기(坊記)〉에 이르기를 “《노춘추(魯春秋)》에 부인(夫人)의 성(姓)은 버리고 오(吳)라고 말하였고, 그(夫人)의 죽음을 ‘맹자(孟子)가 졸(卒)하다’라고 말하였다.” 하였으니, 이에서 구사(舊史≒옜 노나라 역사)에도 ‘맹자졸(孟子卒)’로 기록되었으며, 마침내 중니(仲尼)가 《춘추(春秋)》를 수찬(修撰)하실 때 노(魯)나라 사람들이 이미 그 잘못을 알면서도 숨기고서 희씨(姬氏)라고 칭하지 않고 나라의 수치(≒惡)를 숨김이 예(禮)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고치지 않으셨으니, 시대에 순응하신 까닭인 것이다.
《魯春秋》去夫人之姓曰吳,《春秋》無此文。《坊記》云然者,禮:夫人初至必書於冊。
《노 춘추(魯春秋)》에 부인의 성(姓)을 없애고 오(吳)라고 말했으며,《춘추(春秋)》에도 이 문구가 없다。《방기(坊記)》에 그렇게 말한 것은, 예(禮)에 부인(夫人)이 처음 오면 반드시 사책(史冊)에 기록하기 때문이다.
若娶齊女,則云:“夫人薑氏至自齊。”此孟子初至之時,亦當書曰:“夫人姬氏至自吳。”同姓不得稱姬,舊史所書,蓋直云夫人至自吳。是去夫人之姓,直書曰吳而已。
만약 제(齊)나라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 이르기를 ‘부인(夫人) 강씨(姜氏)가 제(齊)나라로 부터 왔다.’라고 하였으며, 이 맹자(孟子)가 처음 왔을 때도 또한 마땅히《서(書)》에 말하기를 ‘부인(夫人) 희씨(姬氏)가 오(吳)나라에서 왔다.’라고 기록했어야 한다. 동성(同姓)이어서 희씨(姬氏)를 칭하지 못하니 구사(舊史)에 기록한 바가 대개 직접 이르기를 ‘부인(夫人)이 오(吳)나라에서 왔다.’라고만 하였으이니, 이것이 부인의 성(姓)은 삭제(削除)하고 직접 기록하여 오(吳≒國名)만을 말했을 뿐이다.
仲尼脩《春秋》,以犯禮明著,全去其文,故經無其事也。
중니(仲尼)께서 《춘추(春秋)》를 수찬(修撰)하실 때 〈소공(昭公)이〉 예(禮)를 범한 일이 분명히 드러나 그 글을 완전히 삭제하셨기 때문에 경문(經文)에 이 일이 없는 것이다.
○注“ 孔曰”至“為過”。
○ <집해(集解)> 주(注)의 “[공왈(孔曰)]에서 [위과(爲過)]까지"
○正義曰:云“諱國惡,禮也”者,僖元年《左傳》文也。
○正義曰:<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나라의 악(惡)을 숨기는 것이 예(禮)이다[諱國惡 禮也]"라는 것은, 희공(僖公) 원년(元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글이다.
案《坊記》云:“善則稱君,過則稱已,則民作忠。善則稱親,過則稱已,則民作孝。”是君親之惡,務於欲掩之,是故聖賢作法,通有諱例。
《예기(禮記)》 〈방기(坊記)〉를 살펴보건대 이르기를 “잘하면 군주를 칭찬(稱讚)하고 허물이면 자기를 가리키(≒稱)면 백성들이 충성(忠誠)을 하고, 잘하면 부모를 칭찬(稱讚)하고 허물이면 자기를 가리키(≒稱)면 백성들이 효도(孝道)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군주와 어버이의 잘못(≒惡)을 덮고자 힘쓰는 것이며, 이러하기 때문에 성현(聖賢)이 법(法)을 만들기를 숨기는 사례(事例)를 통함이 있도록 했다.
杜預曰:“有時而聽之則可也,正以為後法則不經,故不奪其所諱,亦不為之定製。”言若正為後法,每事皆諱,則為惡者無複忌憚,居上者不知所懲,不可盡令諱也。
두예(杜預)가 말하기를 “<숨기는 것이> 때에 맞아서 들어 주면 괜찮지만, 정상(正常)으로 여기고 후세에 본받더라도 법규(法規)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숨기는 바를 금하지 않았으며, 또 확정(確定)한 제도(制度)로 삼지도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만약 바름으로 여기고 후세의 법으로 삼고서 매사(每事)를 모두 숨기면, 악(惡)을 저지르는 자가 다시 꺼리는(忌憚) 바가 없고, 윗자리에 있는 자가 징계(懲戒)할 바를 모를 것이니, 모두 숨기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人之所極,唯君與親,才有小惡,即發其短,非複臣子之心,全無愛敬之義。
사람이 다해야 할 바는 오직 군주와 어버이뿐인데, <군주와 어버이> 재주가 작은 잘못(≒惡)이 있으면 즉시 그 단점을 들추어내는 것은 신하와 자식의 마음이 거듭 아니며 사랑하고 공경함의 뜻이 전혀 없다.
是故不抑不勸,有時聽之,以為諱惡者禮也,無隱者直也,二者俱通以為世教也。
이러한 때문에 <숨기는 것을> 억제하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으며 때에 맞게 허락하며, 악(惡)을 숨기(≒諱)는 것은 예(禮)이고 숨김이 없는 것은 곧음(≒直)으로 여기는 것이니, 이 두 가지를 모두 통하여 세상을 교화하는 것으로 삼을 수 있다.
云“聖人道弘,故受以為過”者,孔子所言,雖是諱國惡之禮,聖人之道弘大,故受以為過也。
<집해(集解) 주(注)에> 이르기를"성인(聖人)의 도(道)는 넓기 때문에 받아들여 잘못으로 여겼다[聖人道弘 故受以爲過]"라는 것은, 공자께서 〈소공이 예를 아셨다고〉 말씀하신 바는 비록 이것이 나라의 악함을 숨기신 예(禮)이지만, 성인(聖人)의 도(道)가 넓고 크기 때문에 <사패(司敗)의 비난을> 받아들여 그로써 잘못으로 삼으신 것이다.
孔子得巫馬期之言,稱已名云:是已幸受以為過。故云:苟有過,人必知之。
공자(孔子)께서 무마기(巫馬期)의 말을 듣고 자기 이름을 칭하며 이르시기를 ‘이것은 나의 다행이다.’라고 하며 <사패의 비난을> 받아들여 허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진실로 허물이 있으면 남들이 반드시 아는구나.”라고 하셨다.
所以然者,昭公不知禮,我答云知禮。若使司敗不譏我,則千載之後,遂永信我言,用昭公所行為知禮,則亂禮之事,從我而始。
그러한 것의 까닭은, 소공(昭公)이 예(禮)를 알지 못하였는데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예를 아셨다.’고 하였는데, 만약 사패(司敗)로 하여금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천년 뒤에 마침내 영원히 우리의 말을 믿고서 소공(昭公)이 행한 바가 예(禮)를 알고 실천한 것으로 사용한다면 예(禮)를 어지럽히는 일이 우리를 따라서 비롯될 것이다.
今得司敗見非而受以為過,則後人不謬,故我所以為幸也。
지금 사패(司敗)의 비난(非難)을 듣고서 받아들이고서 허물로 삼는다면 후인(後人)들이 오해(誤解)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행으로 여기는 바인 것이다.
繆協云:“諱則非諱。若受而為過,則所諱者又以明矣,亦非諱也。
목협(繆協)이 이르기를 “숨긴 것은 잘못이 아니다.만약 받아들여서 허물로 삼는다면 숨긴 바의 것이 더욱 분명해지니, 또한 숨겼어도 숨긴 것이 아니다.
曏司敗之問,則詭言以為諱,今苟將明其義,故曏之言為合禮也。苟曰合禮,則不為黨矣。若不受過,則何禮之有乎?”
앞서 사패(司敗)의 물음에 거짓말로서 숨겼으나, 지금 진실로 그 뜻을 밝히고자 하셨기 때문에 앞서 하신 말씀은 예(禮)에 부합한 것이 된다. 진실로 예(禮)에 부합하였다면 당(黨)을 한 것이 아니지만 만약 허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찌 예(禮)에 부합하였다고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 『論語』 원문
◎ 《述而》篇 7 - 31
◆ 陳司敗問: "昭公知禮乎?" 孔子曰: "知禮." 孔子退. 揖巫馬期而進之, 曰: "吾聞君子不黨, 君子亦黨乎? 君取於吳, 爲同姓, 謂之吳孟子. 君而知禮, 孰不知禮?" 巫馬期以告, 子曰: "丘也幸, 苟有過, 人必知之."
◎《논어집해(論語集解)》
陳司敗問:「昭公知禮乎?」(孔曰:「 司敗,官名,陳大夫。昭公,魯昭公。」 ) 孔子曰:「知禮。」孔子退,揖巫馬期而進之,曰:「吾聞君子不黨,君子亦黨乎?君取於吳,為同姓,謂之吳孟子。君而知禮,孰不知禮?」(孔曰:「巫馬期,弟子,名施。相助匿非曰黨。魯,吳俱姬姓,禮同姓不昏,而君取之;當稱吳姬,諱曰孟子。」 )巫馬期以告。子曰:「丘也幸,苟有過,人必知之。」(孔曰:「以司敗之言告也。諱國惡,禮也。聖人道弘,故受以為過。」 )
◎《논어주소(論語註疏)》
疏 “ 陳司”至“知之”。
○正義曰:此章記孔子諱國惡之禮也。
“陳司敗問:昭公知禮乎”者,陳大夫為司寇之官,舊聞魯昭公有違禮之事,故問孔子,昭公知禮乎。
“孔子曰:知禮”者,答言昭公知禮也。
“孔子退,揖巫馬期而進之,曰:吾聞君子不黨,君子亦黨乎”者,相助匿非曰黨。
孔子既答司敗而退去,司敗複揖弟子巫馬期而進之,問曰:“我聞君子不阿黨,今孔子言昭公知禮,乃是君子亦有黨乎?
“君取於吳,為同姓,謂之吳孟子。君而知禮,孰不知禮”者,孰,誰也。魯、吳俱姬姓。
禮同姓不昏,而君取之,當稱吳姬。為是同姓,諱之,故謂之吳孟子。若以魯君昭公而為知禮,又誰不知禮也?
“巫馬期以告,子曰:丘也幸,苟有過,人必知之”者,巫馬期以司敗之言告孔子也。
孔子初言昭公知禮,是諱國惡也。諱國惡,禮也。但聖人道弘,故受以為過,言丘也幸,苟有過,人必知之也。
○注“司敗,官名,陳大夫”。
○正義曰:文十一年《左傳》云:楚子西曰:“臣歸死於司敗也。”
杜注云“陳、楚名司寇為司敗”也。
《傳》言歸死於司敗,知司敗主刑之官,司寇是也。
此云陳司敗,楚子西亦云司敗,知陳、楚同此名也。
○注“ 孔曰”至“孟子”。
○正義曰:云“巫馬期弟子,名施”者,《史記·弟子傳》云:“巫馬施字子旗,少孔子三十歲。”鄭玄云:“魯人也。”
云“魯、吳俱姬姓”者,魯,周公之後;吳,泰伯之後,故云俱姬姓也。
云“禮同姓不昏”者,《曲禮》云:“取妻不取同姓,故買妾不知其姓則卜之。”
又《大傳》曰:“係之以姓而弗別,綴之以食而弗殊,雖百世而昏姻不通者,周道然也。”
云“而君取之,當稱吳姬,而諱曰孟子”者,案《春秋》哀十二年:“夏,五月,甲辰,孟子卒。”《左氏傳》曰:“昭公娶於吳,故不書姓。”
此云“君娶於吳,為同姓,謂之吳孟子”,是魯人常言稱孟子也。
《坊記》云:“《魯春秋》去夫人之姓曰吳,其死曰孟子卒。”是舊史書為“孟子卒”,及仲尼脩《春秋》,以魯人已知其非,諱而不稱姬氏。諱國惡,禮也,因而不改,所以順時世也。
《魯春秋》去夫人之姓曰吳,《春秋》無此文。
《坊記》云然者,禮:夫人初至必書於冊。
若娶齊女,則云:“夫人薑氏至自齊。”此孟子初至之時,亦當書曰:“夫人姬氏至自吳。”同姓不得稱姬,舊史所書,蓋直云夫人至自吳。是去夫人之姓,直書曰吳而已。仲尼脩《春秋》,以犯禮明著,全去其文,故經無其事也。
○注“ 孔曰”至“為過”。
○正義曰:云“諱國惡,禮也”者,僖元年《左傳》文也。
案《坊記》云:“善則稱君,過則稱已,則民作忠。善則稱親,過則稱已,則民作孝。”是君親之惡,務於欲掩之,是故聖賢作法,通有諱例。
杜預曰:“有時而聽之則可也,正以為後法則不經,故不奪其所諱,亦不為之定製。”
言若正為後法,每事皆諱,則為惡者無複忌憚,居上者不知所懲,不可盡令諱也。
人之所極,唯君與親,才有小惡,即發其短,非複臣子之心,全無愛敬之義。
是故不抑不勸,有時聽之,以為諱惡者禮也,無隱者直也,二者俱通以為世教也。
云“聖人道弘,故受以為過”者,孔子所言,雖是諱國惡之禮,聖人之道弘大,故受以為過也。
孔子得巫馬期之言,稱已名云:是已幸受以為過。故云:苟有過,人必知之。
所以然者,昭公不知禮,我答云知禮。若使司敗不譏我,則千載之後,遂永信我言,用昭公所行為知禮,則亂禮之事,從我而始。
今得司敗見非而受以為過,則後人不謬,故我所以為幸也。
繆協云:“諱則非諱。若受而為過,則所諱者又以明矣,亦非諱也。
曏司敗之問,則詭言以為諱,今苟將明其義,故曏之言為合禮也。
苟曰合禮,則不為黨矣。若不受過,則何禮之有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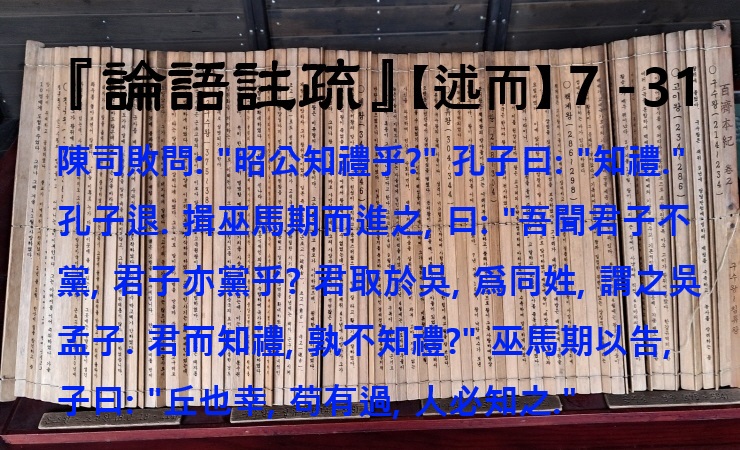
'◑논어주소(注疏)[刑昺] > 7.술이(述而)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논어주소(論語註疏)』 《술이(述而)》 卷 7 - 33 (1) | 2025.04.02 |
|---|---|
| ◎ 『논어주소(論語註疏)』 《술이(述而)》 卷 7 - 32 (0) | 2025.03.31 |
| ◎ 『논어주소(論語註疏)』 《술이(述而)》 卷 7 - 30 (0) | 2025.03.27 |
| ◎ 『논어주소(論語註疏)』 《술이(述而)》 卷 7 - 29 (0) | 2025.03.25 |
| ◎ 『논어주소(論語註疏)』 《술이(述而)》 卷 7 - 28 (0) | 2025.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