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어(論語)』
卷 8
◎ 《태백(泰伯)》篇
◆ 8 - 4) 曾子有疾, 孟敬子問之. 曾子言曰: "鳥之將死, 其鳴也哀; 人之將死, 其言也善. 君子所貴乎道者三: 動容貌, 斯遠暴慢矣; 正顔色, 斯近信矣; 出辭氣, 斯遠鄙倍矣. 籩豆之事, 則有司存."
(증자유질, 맹경자문지. 증자언왈: "조지장사, 기명야애; 인지장사, 기언야선. 군자소귀호도자삼: 동용모, 사원포만의; 정안색, 사근신의; 출사기, 사원비배의. 변두지사, 즉유사존.")
증자(曾子)가 병이 들자 맹경자(孟敬子)가 문병을 갔다. 증자가 말하기를 “장차 새가 죽을 적에는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장차 죽을 적에는 그 말이 선합니다. 군자는 도(道)에 귀한 바가 세 가지인데, 용모(容貌)를 움직여서 사나움과 거만함을 멀리하고, 안색(顔色)을 바로하여 믿음에 가깝도록 하며, 말하는 기운을 낼 적에는 저속하고 어긋남을 멀리합니다. 제기를 다루는 일이라면 담당자가 있습니다.”라고 했다.
◎《논어집해(論語集解)》
【集解】 曾子有疾,孟敬子問之。(馬曰:「孟敬子,魯大夫仲孫捷。」 ◎마융이 말하였다:“맹경자(孟敬子)”는 노(魯)나라 대부인 중손첩(仲孫捷)이다.)曾子言曰:「鳥之將死,其鳴也哀。人之將死,其言也善。(包曰:「欲戒敬子,言我將死,言善可用。」 ◎포함이 말하였다:맹경자가 경계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장차 죽을 적에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君子所貴乎道者三:動容貌,斯遠暴慢矣;正顏色,斯近信矣;出辭氣,斯遠鄙倍矣。(鄭曰:「此道謂禮也。動容貌,能濟濟蹌蹌,則人不敢暴慢之;正顏色,能矜莊嚴栗,則人不敢欺詐之;出辭氣,能順而說之,則無惡戾之言入於耳。」 ◎정현이 말하였다:이러한 도(道)를 예(禮)라고 말하는 것이다. “동용모(動容貌)”는 위엄(威嚴)있고 단정(端整)함을 잘하면 남들이 감히 사납고 오만하게 못하고, “정안색(正顏色)”은 장중(莊重)하고 엄숙(嚴肅)함을 잘하면 남들이 감히 속이지 못하며, “출사기(出辭氣)”는 공순(恭順)하면서 설명을 잘하면 사납고 궂은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籩豆之事,則有司存。」(包曰:「敬子忽大務小,故又戒之以此。籩豆,禮器。」 ◎포함이 말하였다:맹경자(孟敬子)가 큰 일을 소흘히 하고 작은 일에 힘썼기 때문에 또 이로서 경계시킨 것이다. “변두(籩豆)”는 예절에 쓰이는 그릇이다.)
◎《논어주소(論語註疏)》
『논어주소(論語註疏)』는 공자(孔子, B.C.551~B.C.479)가 지은 논어(論語)에 하안(何晏, 193~249 魏)이 주(註)를 달아 논어집해(論語集解)를 지었으며, 북송(北宋)의 형병(邢昺, 932~1010)이 논어집해(論語集解)에 소(疏)를 붙여서 논어주소(論語註疏)를 지었다.
○ 【註疏】 <경문(經文)의> “[증자(曾子)]에서 [사존(司存)]까지"
○正義曰:此章貴禮也。
○ 正義曰 : 이 장(章)은 예(禮)를 귀하게 여긴 것이다.
“曾子有疾,孟敬子問之”者,來問疾也。
<경문(經文)에서> "증자(曾子)가 병이 들자 맹경자(孟敬子)가 문병을 갔다[曾子有疾 孟敬子問之]"라는 것은, 〈맹경자(孟敬子)가〉 와서 문병(問病)을 한 것이다.
“曾子言曰:鳥之將死,其鳴也哀。人之將死,其言也善”者,曾子因敬子來問已疾,將欲戒之,先以此言告之,言我將死,言善可用也。
<경문(經文)에서> "증자가 말하기를 '장차 새가 죽을 적에는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장차 죽을 적에는 그 말이 선합니다[曾子言曰 鳥之將死 其鳴也哀 人之將死 其言也善]"라는 것은, 증자(曾子)는, 맹경자(孟敬子)가 와서 자기의 병(病)을 위문(慰問)하면서 장차 경계를 하도록 먼저 이 말을 일러준 것이니, ‘우리가 장차 죽게 되면, 말이 착하여 쓸 만할 것이다.’라는 말이다.
“君子所貴乎道者三:動容貌斯遠暴慢矣,正顏色斯近信矣,出辭氣斯遠鄙倍矣”者,此其所戒之辭也。道,謂禮也。
<경문(經文)에서> "군자는 도(道)에 귀한 바가 세 가지인데, 용모(容貌)를 움직여서 사나움과 거만함을 멀리하고, 안색(顔色)을 바로하여 믿음에 가깝도록 하며, 말하는 기운을 낼 적에는 저속하고 어긋남을 멀리합니다[君子所貴乎道者三 動容貌 斯遠暴慢矣 正顔色 斯近信矣 出辭氣 斯遠鄙倍矣]"라는 것은, 이것은 그<증자(曾子)가 맹경자(孟敬子)>를 경계한 바의 말이다. 도(道)는 예(禮)를 말하는 것이다.
言君子所崇貴乎禮者有三事也:動容貌,能濟濟蹌蹌,則人不敢暴慢之;正顏色,能矜莊嚴栗,則人不敢欺誕之;出辭氣,能順而說之,則無鄙惡倍戾之言入於耳也。
군자(君子)가 예(禮)를 귀하게 숭상하는 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용모(容貌)를 움직일 때 위엄(威嚴)있고 단정(端整)함을 잘하면 남들이 감히 사납고 오만하게 못하고, 안색(顔色)을 바르게 하여 장중(莊重)하고 엄숙(嚴肅)함을 잘하면 남들이 감히 속이지 못하며, 말을 하는 기운을 공순(恭順)하면서 설명을 잘하면 사납고 궂은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人之相接,先見容貌,次觀顏色,次交言語,故三者相次而言也。暴慢鄙倍,同是惡事,故俱云遠。信是善事,故云近也。
사람이 서로 접견(接見) 할 적에는, 먼저 용모(容貌)를 보고, 다음에 안색(顔色)을 살피며, 다음에 말을 서로 나누기 때문에 세 가지를 차례로 하여서 말한 것이다. 폭만(暴慢)과 비배(鄙倍)가 똑같이 나쁜 일이기 때문에 모두 이르기를 ‘멀다[遠]’라 하였고, 믿음(信)은 바로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르기를 ‘가깝다[近]’라고 한 것이다.
“籩豆之事,則有司存”者,敬子輕忽大事,務行小事,故又戒之以此。籩豆,禮器也。言執籩豆行禮之事,則有所主者存焉。此乃事之小者,無用親之。
<경문(經文)에서> "제기를 다루는 일이라면 담당자가 있습니다[籩豆之事 則有司存]"라는 것은, 맹경자(孟敬子)가 큰일은 가벼이 여기고 작은 일을 행하는 데 힘썼기 때문에 다시 이 말로서 경계를 하였다. 변두(籩豆)는 예기(禮器)이다. 변두(籩豆)를 잡고 예(禮)를 행하는 일이라면 주관하는 자가 그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일이 작은 것이니 직접 챙길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注“孟敬子,魯大夫仲孫捷”。
○ <집해(集解)> 주(注)의 “맹경자는 노(魯)나라 대부인 중손첩(仲孫捷)이다[孟敬子 魯大夫仲孫捷]까지"
○正義曰:鄭玄注《檀弓》云:“敬子,武伯之子,名捷。”是也。
○正義曰: 《예기(禮記)》 〈단궁(檀弓)〉의 정현(鄭玄) 주(注)에 이르기를 “맹경자(孟敬子)는 맹부백(孟武伯)의 아들이고 이름은 첩(捷)이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 사람이다.
○注“包曰:欲戒敬子,言我將死,言善可用”。
○ <집해(集解)> 주(注)의 “맹경자가 경계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장차 죽을 적에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欲戒敬子 言我將死 言善可用]]까지"
○正義曰:案《春秋左氏傳》魏顆父病困,命使殺妾以殉。
○正義曰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을 살펴보건데, 위과(魏顆)의 부친이 병세(病勢)가 위독할 적에 “첩(妾)을 죽여서 순장(殉葬)을 하도록 명하였다.
又晉趙孟、孝伯並將死,其語偷。又晉程鄭問降階之道,鄭然明以將死而有惑疾。此等並是將死之時,其言皆變常。
또 진(晉)나라 조맹(趙孟)과 <노(魯)나라> 효백(孝伯)이 모두 죽으려 할 적에 그 말이 구차(苟且)하였고, 또 진(晉)나라 정정(程鄭)이 관계(官階)를 낮추는 도리를 물었는데, 정(鄭)나라 연명(然明)이 “죽을 때가 되어서 의심하는 병(病)이 생겼다.”라고 하였으니, 이들은 모두 바로 장차 죽으려 하는 때이니 그 말이 상도(常道)에서 벗어났다.
而曾子云“人之將死,其言也善”者,但人之疾患有深有淺,淺則神正,深則神亂。故魏顆父初欲嫁妾是其神正之時。曾子云“其言也善”,是其未困之日。
그런데 증자(曾子)가 이르기를 “사람이 장차 죽으려 하면 그 말이 착하다.”라고 한 것은, 단지 사람의 질병(疾病)에는 심함이 있고 가벼움이 있으며 가벼우면 정신이 바르지만 심하면 정신이 혼란하다. 그러므로 위과(魏顆)의 아버지가 처음에 첩을 개가(改嫁)시키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정신이 바를 때 이었고, 증자(曾子)가 이르기를 “그 말이 착하다.”라고 한 것은, 바로 아직 위독하지 않은 날이었다.
且曾子,賢人,至困猶善。其中庸已下,未有疾病,天奪之魄,苟欲偷生,則趙孟、孝伯、程鄭之徒不足怪也。
또 증자(曾子)는 현명한 사람이니 <병세가> 위독함에 이르렀어도 오히려 <말이> 착했지만, 그 가운데 이하를 행동하는 <사람이라 > 면 질병이 없더라도 하늘이 정신을 빼앗아 진실로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니, 그렇다면 조맹(趙孟)‧이백(孝伯)‧정정(程鄭)의 무리가 충분히 괴이(怪異)하지 않은 것이다.
○注“籩豆,禮器”。
○ <집해(集解)> 주(注)의 “변두(籩豆)는 예절에 쓰는 그릇이다[籩豆 禮器]까지"
○正義曰:《周禮·天官》:“籩人掌四籩之實。”“醢人掌四豆之實。”
○正義曰 : 《주례(周禮)》 〈천관(天官)〉에 “변인(籩人)은 네 차례 제기(籩)에 음식물을 담는 일을 담당한다.”라고 하고, “해인(醢人)은 네 차례 제기(豆)에 음식물을 담는 일을 담당한다.”라고 하였다.
鄭注云:“籩,竹器如豆者,其容實皆四升。” 《釋器》云:“木豆謂之豆。竹豆謂之籩。”豆盛菹醢,籩盛棗栗,以供祭祀享燕,故云禮器也。
정현(鄭玄)이 주(注)에 이르기를 “변(籩)은 대나무 그릇으로 두(豆)와 같은 것이며, 그 음식을 담는 용량은 모두 4승(升)이다.”라고 하였고, 《이아(爾雅)》 〈석기(釋器)〉에 이르기를 “목두(木豆)를 말하기를 두(豆)라고 하며, 죽두(竹豆)를 말하기를 변(籩)이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두(豆)에는 저해(菹醢肉醬)를 담고 변(籩)에는 대추와 밤을 담아 그로써 제사(祭祀)와 향연(享宴)에 올리기 때문에 이르기를 "예기(禮器)"라고 한 것이다.
▣ 『論語』 원문
◎ 《泰伯》篇 8 - 4
◆ 曾子有疾, 孟敬子問之. 曾子言曰: "鳥之將死, 其鳴也哀; 人之將死, 其言也善. 君子所貴乎道者三: 動容貌, 斯遠暴慢矣; 正顔色, 斯近信矣; 出辭氣, 斯遠鄙倍矣. 籩豆之事, 則有司存."
◎《논어집해(論語集解)》
曾子有疾,孟敬子問之。(馬曰:「孟敬子,魯大夫仲孫捷。」 )曾子言曰:「鳥之將死,其鳴也哀。人之將死,其言也善。(包曰:「欲戒敬子,言我將死,言善可用。」 )君子所貴乎道者三:動容貌,斯遠暴慢矣;正顏色,斯近信矣;出辭氣,斯遠鄙倍矣。(鄭曰:「此道謂禮也。動容貌,能濟濟蹌蹌,則人不敢暴慢之;正顏色,能矜莊嚴栗,則人不敢欺詐之;出辭氣,能順而說之,則無惡戾之言入於耳。」)籩豆之事,則有司存。」(包曰:「敬子忽大務小,故又戒之以此。籩豆,禮器。」 )
◎《논어주소(論語註疏)》
疏“ 曾子”至“司存”。
○正義曰:此章貴禮也。
“曾子有疾,孟敬子問之”者,來問疾也。
“曾子言曰:鳥之將死,其鳴也哀。人之將死,其言也善”者,曾子因敬子來問已疾,將欲戒之,先以此言告之,言我將死,言善可用也。
“君子所貴乎道者三:動容貌斯遠暴慢矣,正顏色斯近信矣,出辭氣斯遠鄙倍矣”者,此其所戒之辭也。道,謂禮也。言君子所崇貴乎禮者有三事也:動容貌,能濟濟蹌蹌,則人不敢暴慢之;正顏色,能矜莊嚴栗,則人不敢欺誕之;出辭氣,能順而說之,則無鄙惡倍戾之言入於耳也。
人之相接,先見容貌,次觀顏色,次交言語,故三者相次而言也。暴慢鄙倍,同是惡事,故俱云遠。信是善事,故云近也。
“籩豆之事,則有司存”者,敬子輕忽大事,務行小事,故又戒之以此。籩豆,禮器也。言執籩豆行禮之事,則有所主者存焉。此乃事之小者,無用親之。
○注“孟敬子,魯大夫仲孫捷”。
○正義曰:鄭玄注《檀弓》云:“敬子,武伯之子,名捷。”是也。
○注“包曰:欲戒敬子,言我將死,言善可用”。
○正義曰:案《春秋左氏傳》魏顆父病困,命使殺妾以殉。又晉趙孟、孝伯並將死,其語偷。又晉程鄭問降階之道,鄭然明以將死而有惑疾。此等並是將死之時,其言皆變常。而曾子云“人之將死,其言也善”者,但人之疾患有深有淺,淺則神正,深則神亂。故魏顆父初欲嫁妾是其神正之時。曾子云“其言也善”,是其未困之日。且曾子,賢人,至困猶善。其中庸已下,未有疾病,天奪之魄,苟欲偷生,則趙孟、孝伯、程鄭之徒不足怪也。
○注“籩豆,禮器”。
○正義曰:《周禮·天官》:“籩人掌四籩之實。”“醢人掌四豆之實。”
鄭注云:“籩,竹器如豆者,其容實皆四升。”《釋器》云:“木豆謂之豆。竹豆謂之籩。”豆盛菹醢,籩盛棗栗,以供祭祀享燕,故云禮器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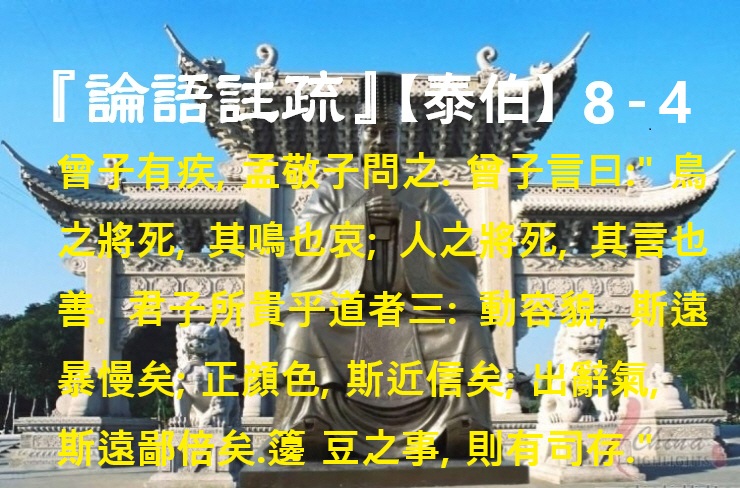
'◑논어주소(注疏)[刑昺] > 8.태백(泰伯)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논어주소(論語註疏)』 《태백(泰伯)》 卷 8 - 6 (1) | 2025.04.24 |
|---|---|
| ◎ 『논어주소(論語註疏)』 《태백(泰伯)》 卷 8 - 5 (1) | 2025.04.22 |
| ◎ 『논어주소(論語註疏)』 《태백(泰伯)》 卷 8 - 3 (0) | 2025.04.18 |
| ◎ 『논어주소(論語註疏)』 《태백(泰伯)》 卷 8 - 2 (0) | 2025.04.16 |
| ◎ 『논어주소(論語註疏)』 《태백(泰伯)》 卷 8 - 1 (1) | 2025.0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