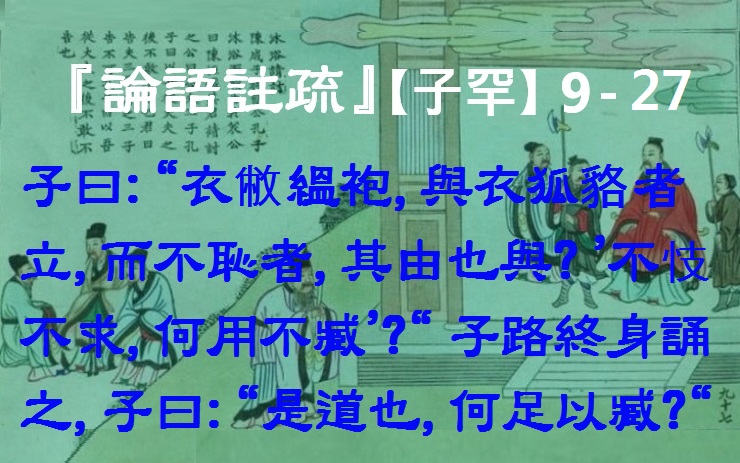◎ 『논어주소(論語註疏)』 《자한(子罕)》 卷 9 - 27
▣ 『논어(論語)』
卷 9
◎ 《자한(子罕)》篇
◆ 9 - 27) 子曰: "衣敝縕袍, 與衣狐貉者立, 而不恥者, 其由也與? '不忮不求, 何用不臧'?" 子路終身誦之, 子曰: "是道也, 何足以臧?"
(자왈: "의폐온포, 여의호학자립, 이불치자, 기유야여? '불기불구, 하용불장'?" 자로종신송지, 자왈: "시도야, 하족이장?")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헌 솜옷을 입고 여우나 오소리 갖옷을 입은 자와 함께 서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는 유(由≒子路) 이겠지? 《시경(詩經)》에 ‘해치지 않고 탐하지도 않으니 어찌 착하지 않은가?’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자 자로가 항상 그것을 암송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 도(道)가 어찌 착함으로 충분하겠느냐?”
◎《논어집해(論語集解)》
【集解】 子曰:「衣敝縕袍,與衣狐貉者立而不恥者,其由也與?(孔曰:「縕,枲著。」 ◎공안국이 말하였다:“온(縕: 헌솜 온)”은 시착(枲著≒모시에 솜을 넣고 누빈 옷)이다.)『不忮不求,何用不臧?』」(馬曰:「忮,害也。臧,善也。言不忮害,不貪求,何用為不善?疾貪惡忮害之詩。」 ◎마융이 말하였다:“기(忮: 해칠 기)”는 해침이다. “장(臧: 착할 장)”은 착함이다. '크게 해치지 않고 매우 탐하지도 않으니 어찌 착하지 않게 되겠는가?'라는 말이며, 탐함을 질책하고 크게 해침을 미워한 시(詩)이다.) 子路終身誦之。子曰:「是道也,何足以臧?」(馬曰:「臧,善也。尚複有美於是者,何足以為善?」 ◎마융이 말하였다:“장(臧: 착할 장)”은 착함이다. 오히려 이 보다 더욱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어찌 착함으로 충분하겠는가?)
◎《논어주소(論語註疏)》
○ 【註疏】 <경문(經文)의> “[자왈(子曰]에서 [이장(以臧)]까지"
○正義曰:此章善仲由也。
○ 正義曰 : 이 장(章)은 중유(仲由≒子路)를 칭찬한 것이다.
“子曰:衣敝縕袍,與衣狐貉者立而不恥者,其由也與”者,縕,枲著也。縕袍,衣之賤者。狐貉,裘之貴者。
<경문(經文)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헌 솜옷을 입고 여우나 오소리 갖옷을 입은 자와 함께 서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는 유(由≒子路) 이겠지?[子曰 衣敝縕袍 與衣狐貉者立而不恥者 其由也與]"라는 것은, 온(縕: 헌솜 온)은 시착(枲著≒모시에 솜을 넣고 누빈 옷)이다. 온포(縕袍)는 천(賤)한 자의 옷이고, 호학(狐貉)은 귀(貴)한 자의 갖옷이다.
常人之情,著破敗之縕袍,與著狐貉之裘者並立,則皆慚恥。而能不恥者,唯其仲由也與?
보통 사람의 마음은 찢어지고 누빈 솜옷을 입고서 여우나 담비 갖옷을 입은 자와 나란히 서 있으면 모두 매우 부끄러워하는데도 능히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오직 중유(仲由) 이겠지?.
“不忮不求,何用不臧”者,忮,害也。臧,善也。言不忮害,不貪求,何用為不善?言仲由不忮害,不貪求,何用為不善?
<경문(經文)에서> "해치지 않고 탐하지도 않으니 어찌 착하지 않은가?[不忮不求 何用不臧]"라는 것은, 기(忮: 해칠 기)는 해침이고, 장(臧: 착할 장)은 착함이다. 크게 해치지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면 어찌 착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중유(仲由)가 크게 해치지 않고 탐하지도 않으니 어찌 착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此《詩·邶風·雄雉》之篇,疾貪惡忮害之詩也。孔子言之,以善子路也。
이는 《시경(詩經)》 〈패풍(邶風) 웅치(雄雉)〉의 편(篇)인데, 탐함을 질책하고 크게 해침을 미워한 시(詩)이다. 공자(孔子)께서 자로(子路)를 착함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子路終身誦之”者,子路以夫子善已,故常稱誦之。
<경문(經文)에서> "자로가 항상 그것을 암송했다[子路終身誦之]"라는 것은, 자로(子路)는 부자(夫子)께서 자기를 착함으로 하셨기 때문에 항상 칭하여 시(詩)를 암송(暗誦)했다.
“子曰:是道也,何足以臧”者,孔子見子路誦之不止,懼其伐善,故抑之。言人行尚複有美於是者,此何足以為善?
<경문(經文)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 도(道)가 어찌 착함으로 충분하겠느냐?'[子曰 是道也何足以臧]"라는 것은, 공자(孔子)께서 자로(子路)가 암송하기를 그치지 않음을 보시고 <자로(子路)가> 착함을 자랑할까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억누르신 것이다. '사람의 행동은 오히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찌 착함으로 넉넉하게 여기 것이겠느냐?'고 말씀하셨다.
○注“孔曰:縕,枲著”。
○ <집해(集解)> 주(注)의 “공안국이 말하였다. '온(縕: 헌솜 온)”은 시착(枲著≒모시에 솜을 넣고 누빈 옷)이다.'[孔曰 縕 枲著]까지"
○正義曰:《玉藻》云:“纊為繭,縕為袍。”
○正義曰 :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이르기를 “광(纊: 솜 광≒햇 솜)으로 <지은 옷을> 견(繭)이라 하고, 온(縕: 헌솜 온≒묵은 솜)으로 <지은 옷을> 포(袍)라 한다.”라고 했다.
鄭玄云:“衣有著之異名也。纊謂今之新綿,縕謂今纊及舊絮也。”然則今云枲著者,雜用枲麻以著袍也。
정현(鄭玄)이 <주(注)에> 이르기를 “옷은 붙이는 <솜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는 것이다. 광(纊)은 오늘날의 햇 솜을 말하고, 온(縕)은 지금의 햇 솜과 묵은 솜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 『論語』 원문
◎ 《子罕》篇 9 - 27
◆ 子曰: "衣敝縕袍, 與衣狐貉者立, 而不恥者, 其由也與? '不忮不求, 何用不臧'?" 子路終身誦之, 子曰: "是道也, 何足以臧?"
◎《논어집해(論語集解)》
子曰:「衣敝縕袍,與衣狐貉者立而不恥者,其由也與?(孔曰:「縕,枲著。」 )『不忮不求,何用不臧?』」(馬曰:「忮,害也。臧,善也。言不忮害,不貪求,何用為不善?疾貪惡忮害之詩。」) 子路終身誦之。子曰:「是道也,何足以臧?」(馬曰:「臧,善也。尚複有美於是者,何足以為善?」)
◎《논어주소(論語註疏)》
疏“ 子曰”至“以臧”。
○正義曰:此章善仲由也。
“子曰:衣敝縕袍,與衣狐貉者立而不恥者,其由也與”者,縕,枲著也。縕袍,衣之賤者。狐貉,裘之貴者。
常人之情,著破敗之縕袍,與著狐貉之裘者並立,則皆慚恥。而能不恥者,唯其仲由也與?
“不忮不求,何用不臧”者,忮,害也。臧,善也。言不忮害,不貪求,何用為不善?言仲由不忮害,不貪求,何用為不善?
此《詩·邶風·雄雉》之篇,疾貪惡忮害之詩也。孔子言之,以善子路也。
“子路終身誦之”者,子路以夫子善已,故常稱誦之。
“子曰:是道也,何足以臧”者,孔子見子路誦之不止,懼其伐善,故抑之。
言人行尚複有美於是者,此何足以為善?
○注“孔曰:縕,枲著”。
○正義曰:《玉藻》云:“纊為繭,縕為袍。”
鄭玄云:“衣有著之異名也。纊謂今之新綿,縕謂今纊及舊絮也。”然則今云枲著者,雜用枲麻以著袍也。